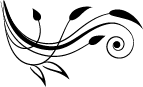무언가에 쫓기며 기도하는 날 (22/8/9)
아르카비스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다. 그의 삶으로부터. 그의 의무로부터. 그가 마땅히 감내했어야 했던 것들로부터. 그의 존재의의였던 에쉬레스토에게서 떨어져 나온 채로. 하염없이. 날 때부터 의식과 육체를 분리하기 쉽게 타고난 까닭에 아르카비스는 모든 굴레를 내던지는 것이 몹시도 간단하고도 쉬웠다. 눈을 감고서 도망쳐버리는 것만 생각해도 되었다. 좁디 좁은 고철덩어리 몸에서 벗어나, 더 넓은 네트워크 저편 어딘가에.
현실 바깥에 실존하는 것들보다 더 번잡하고 더 번쩍이고 더 빠른 그 곳에서 멈추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그가 실제로 보기도 전부터 좋아했던 바다처럼. 넘실거리는 파도에 몸을 맡기듯 아르카비스는 가만히 있어도 되었다. 그리고 그가 한 번도 물 위에 떠오른 적 없었던 것처럼, 그는 이 곳에서마저 한없이 가라앉고 있었다. 오래되어 아무도 들추어보지 않아 삭아버린 데이터 쪼가리 위로. 마치 그처럼 이미 쓸모를 다 해버린 잔해들 위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갑작스럽게 하늘하늘, 어지러이 흔들렸다.
‘이러지 마세요.’
흐릿하게 들리는 목소리는 분명 한 때 그의 일부라고까지 여겼던 것이었다. 에쉬레스토 발더가르트. 아르카비스 브리제펠트의 두 번째 인생을 손에 넣어 휘두르려고 했던 사람. 유일하게 그의 존재를 알아준 사람. 그러나 그 인지는 분명히 선을 넘으려 하고 있었다. 아르카비스는 그들의 관계 끝에 있는 것이 온전하지 못할 것임을 알아버렸다. 뭐 하나 제대로 알게 되기 전에 알아버린 예측은 그를 다급하게 만들었다.
사랑이란 것은 여전히 어려웠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최대한 온전하게 남는 것을 바랐다.
가장 나은 선택은 서로 거리를 두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아르카비스는 에쉬레스토가 제 말을 그리 들어줄 것 같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렇지 않아도 그들 사이에 누군가 자리하는 것조차 거슬려하는 에쉬레스토였다. 말 하나 잘못 꺼냈다가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높았다. 아르카비스는 여전히 의사소통에 불편함을 느꼈다. 차라리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온전히 전달해줄 수 있다면 훨씬 더 편할 텐데. 그렇다면 에쉬레스토도 그리 불안해할 까닭도 없어질 것이다.
아니지, 그걸 불안이라 부를 수 있을까. 아르카비스는 버릇처럼 상념에 잠겨들었다.
아르카비스는 자기 눈으로 본 마지막 순간이 떠올랐다. 무척이나 당황하던 눈초리. 당장이라도 하지 말라고 외칠 것 같았던 에쉬레스토의 입술이. 그 입은 자주 아르카비스에게 사랑한다 속삭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쉬이 잊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에쉬레스토는 다 그를 위해서라고 했으므로. 아르카비스는 단지 받아들이기만 했다. 이제와서는 그것 또한 잘못이었구나 뒤늦게서야 알았을 따름이다. 이처럼 그는 배우는 것이 몹시도 느리다. 그럼에도 지나온 길을 되돌리는 방법은 여즉 없었으므로 아르카비스는 처음으로 무언가를 선택했다. 몸도 고되고 마음도 그에 준하게 아팠지만 어리석은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
남에게는 잘도 휘둘렀던 날붙이로 찌른 목은 차라리 얼얼하기만 했다. 이상하게도.
그것이 우스꽝스러워서, 아르카비스는 에쉬레스토에게 쉽게 웃어줄 수 있었던 것 같았다.
―잘 있어.
목소리가 실제로 나왔는지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다만 에쉬레스토가 눈을 찡그렸으므로 어렴풋하게 들었을 것 같다고 결론지었을 뿐이었다.
또 다시 어지러움과 비슷한 울렁거림이 그를 스치고 지나갔다.
육체에서 벗어난 의식은 느낄 수 없을 감각이. 환상통이라도 되는가.
‘들리잖아요. 듣고 있잖아요.’
차라리 환각에 지나지 않는다면 좋았을걸. 불행하게도 그 말마따나 아르카비스는 여전히 에쉬레스토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손길을 느끼고 있었다. 전해지는 애틋함에 숨이 막혔다. 숨을 쉬고 있지도 않은데. 당장이라도 눈을 뜨고 에쉬레스토를 달래주고 싶어질 것 같아 아르카비스는 눈을 돌렸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게로. 어떤 것도 되어서는 안 될 것들에게로.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고 만다. 그럴 수는 없었다.
아르카비스는 필사적으로 바랐다. 기도했다. 차라리 내게 마음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게 되기에 그가 품고 있던 것들은 몹시도 아름다웠다.
멀리 두면 애처롭게 안타깝고, 가까이 하면 찔리고 베여 아팠지만 에쉬레스토가 건네준 것들은 분명 반짝거리며 빛이 났다. 아르카비스가 아르카비스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니 그는 다 괜찮았다. 괜찮았다고 여겼다. 혹은 괜찮아야 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무작정 다 받아주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을 그 때의 그는 알지 못했다. 무엇이 맞는지 아닌지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했었다.
‘왜 눈을 뜨지 않는 거예요?’
아르카비스는 불현듯 깨달았다. 굳이 주위를 살펴볼 것도 없었다. 소리는 외부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었다. 오로지 그의 안에서. 그가 기억하고 있는 에쉬레스토의 파편들이 부르고 있었다.
그가 에쉬레스토를 그리워하는 만큼.
아, 아르카비스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에도 그는 기도를 멈출 수 없었다. 에쉬레스토와 사이가 멀어질 수 없다면 눈을 뜨지 않기를. 그럼으로써 에쉬레스토가 자기 자신을 망치지 않게 할 수 있기를.
그것이 더한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