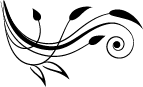그것 하나를 기어코 해줄 수가 없어서 (22/8/12)
말이 안 됐다. 며칠 째 에쉬레스토는 그 단 한 문장에 사로잡혀 다른 생각을 도통 할 수가 없었다. 그야 말이 안 됐으니까. 죽은 듯 잠들어 있는 아르카비스를 볼 때에는 더욱 그러했다. 잠든 아르카비스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이전에도 본 적 없는 차분한 얼굴로, 잠든 듯 고요하게 죽어있었다. 자기가 원하던 대로.
아르카비스 브리제펠트의 육체는 이미 본래 수준을 유지하게 돌려놓았음에도.
에쉬레스토 발더가르트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빌어먹을 현실을 뒤집고 싶었다. 그것으로 제 죄과를 탕감하고 싶었다. 아르카비스가 죽음을 택한 이유가 자기에게 있었다는 것을 없었던 일로 만들고 싶었다.
차라리 그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네가 나 때문에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웃어주지나 말지.
‘너는 나 없이도 잘 살 것 같지만, 내가 계속 너와 함께 있으면 너는 분명 더 망가질 테니까.’
대체 무슨 각오를 해야, 사람이 자기 목을 찌를 수 있지?
그 때의 상처는 이미 진작에 고쳐냈음에도, 에쉬레스토는 여전히 아르카비스의 고운 목을 볼 때면 내골격이 보일 정도로 깔끔하게 벌어진 틈새에서 흘러나온 잔뜩 끊어져 너덜거리는 전선과 인공 근육 섬유들의 환각이 이따금 의심할 수 없는 현실감으로 보이곤 했다.
에쉬레스토는 모든 상흔이 나아도 눈을 뜨지 않는 아르카비스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실은 그도 알고 있었다. 아르카비스는 이대로 영영 눈을 뜨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것은 분명 그의 선택이었다. 에쉬레스토가 놔주지 않을 것을 알아서, 그렇게라도 그는 멀어지려고 시도했다.
그 모든 것을 알고도, 에쉬레스토는 아르카비스를 기어코 되살리려 들었다. 그 놔달라는 작은 메시지 하나조차 들어줄 수 없어서. 부스러진 잔해를 기어코 끌어다 맞추었다.
일어나면 다시 얘기해요.
우리 눈을 마주보고 다시 얘기 좀 해.
그렇게 혼자서만 결정 내리고 떠나가는 게 어디있냐고.
오늘도 일말의 살아있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사람을 붙잡고 뇌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