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을 낱낱이 읽는 게 좋은 건 아니다.
왜? 페레그린은 정말로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건 널 위한 얘기다. 너와 다른 사람의 경계를 알 수 없게 될 수도 있어.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레일린은 여전히 그 말을 못 들은 척 굴었다.
레일린의 부모, 다닐과 카발리에는 이따금 페레그린을 나무라고는 했다. 가문에 전승되는 권능을 배우자마자 주변 사람들에게 손쉽게 휘두르고 다니는 것이 문제였다. 그러나 페레그린의 밑바탕까지 흔들 수 있을 만큼 와 닿는 말이 아니었다. 페레그린에게 아는 것은 곧 남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의미했다. 그런 그에게 뜬구름 잡는 소리는 대수로울 것도 없었다.
“당신들도, 똑같았잖아.”
페레그린은 이미 모든 걸 보고 있었다. 제 부모의 머릿속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그건 그러니까, 권능과 함께 내려오는 또 다른 저주라 할 수 있었다. 가장 가까운 이와 마땅히 공유해야 할 믿음조차 없어지고 마는, 고질적인 저주.
“그러니까. 이제 내 머릿속에서 그만 꺼져.”
누구나 잊고 사는 것들이 있다. 레일린은 본인조차 존재를 잊은 그 그늘진 구석까지 속속들이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을 아낌없이 써왔다. 의식적으로도, 무의식적으로도. 경계를 잃어버려? 헛소리. 그가 그렇게 단호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는 끝끝내 제가 가르고 해체해버린, 그래서 더 이상 저를 앞서 나갈 수 없는 약해빠진 것들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해서. 정말로 그러했나?
질기게도 물고 늘어지는 의문이 또 다시 비수처럼 레일린을 향해 날아들었다. 그러나 슬슬 이것이 꿈이라는 것을 자각한 레일린은 어떠한 답도 내놓지 않고 옷에 묻은 먼지를 털 듯 넘겨버렸다. 누구든 앞질러갈 수 있는 그에게 모든 것은 의미를 잃고 퇴색되어 힘을 잃었다. 하물며는 그 자신마저.
레일린은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었다. 이미 자신이 그 말뜻을 알고 있다는 것조차.
경계를 무너뜨리고 바스러뜨린 끝에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타인을 쉽게 내다버린 것만큼이나 스스로를 내던져버렸다는 것도.
“…….”
다 아는 것을 굳이 훈계하듯이 보여주는 것이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하필이면 채광 좋은 자리에 난 창문으로 밝은 빛이 온통 쏟아지고 있었다. 빌어먹을. 반사적으로 욕지기를 내뱉은 레일린은 잡히는 대로 이불을 내던졌다. 꿈을 꾸지 않아도 자고 일어나면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을 꿈자리도 제대로 뒤숭숭해서는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놓고 있었다.
하여 매서운 그 보랏빛 눈이 또 괜한 희생자를 찾는 것은 그저 일상다반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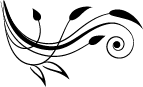
나쁜 놈에게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어요 같은 건 정말 괜한 소리긴 한데
이런 거 적어놓으면 이거도 캐해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는 무슨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딨어 이 나쁜 자식아 관짝은 셀프로 닫아라 (?
아 그리고 얘 부모 얘기도 한 번은 대충이라도 써야겠다 싶은 것도 있었다~ 근데 린에게 그리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서 비중이 적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