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들어 레일린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들었다.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지 낮에 일찍―이라고는 해도 해가 중천일 때긴 했지만 레일린의 평소 행실과 비교하면―나가서는 밤늦게 들어오고는 했다. 덕분에 하루의 절반하고도 더 많은 시간을 레일린의 변덕과 씨름하지 않고 혼자 보낼 수 있게 된 니아흐로서는 두 손만 아니라 두 발까지 들어 환영할 법한 일이었다. 분명 그 사실 자체만 반갑게 받아들일 법도 한데, 어째서 조금씩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는지.
그 자식이 어지간히 미친놈이어야지. 어디서 하던 버릇 못 버리고 행패 부렸다가 처맞고 죽기라도 하면? 오히려 좋은 일인가? 답이 나올 턱이 없는 의문만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집에 돌아올 때의 레일린은 얼굴이 조금 상기되어있을 뿐 다친 곳은 탈탈 털어도 나오지 않았다. 보는 쪽이 기분 나빠질 만큼 상쾌하고 개운한, 적당히 들떠있는 이상한 꼴이긴 했어도.
아니지. 보나마나 또 별것도 아닐 게 뻔했다. 그렇게 니아흐가 관심을 끄려는 순간.
“왜 일어나 있지?”
문제의 레일린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오늘은 낮잠도 건너뛴 니아흐가 신기하기만 했다. 놓고 온 것이 있어 잠깐 가지러 오자 맞닥뜨린 그의 자택 경비원께서는 늘 그렇듯 몹시 뚱하기만 했다. 어디 아픈 것만 아니면 됐지 뭐. 서둘러 챙길 짐을 찾는데, 멀뚱멀뚱 보기만 하던 니아흐가 말을 걸었다.
“새 놀 거리라도 찾았나봐?”
“갑자기 뭔 소리일까. 안 놀아줘서 심심한가?”
“겠냐! 징그럽게.”
투덜거리는 소리는 꽤나 즉각적이었다. 레일린은 바닥을 굴러다니는 지갑을 어렵사리 발견했다. 이게 여기 있었군. 물 흐르는 듯한 동작으로 옷 주머니에 지갑을 쑤셔 넣은 후에 그는 여전히 제 주변을 어정거리는 니아흐를 돌아보았다.
“그럼 뭐가 궁금해서?”
“하나도. 싸돌아다니다가 길거리에서 객사나 해라.”
“아까부터 뭐라고 하는 건지.”
이놈은 내가 어디서 맞고 다니는 줄 아나. 턱도 없는 소리를 들은 양 레일린이 인상을 팍 구겼다. 그대로 니아흐를 지나치려다가, 그는 생각을 바꾸었다.
“심심해서 할 일 없으면 그냥 따라와라.”
“지랄. 이거 놔, 귀찮아!”
“실력 행사하게 하지 말고.”
얌전히 좀 가자. 다분히 협박조로 말을 잘라먹은 레일린이 되는대로 니아흐의 팔을 잡고 끌며 앞장서 걸었다. 깨끗하게 정돈된 시가지를 지나 고르고 골라서 있는지도 몰랐던 음습한 길을. 그리고 더 아래로 아래로. 그렇게 도착한 곳은 간판도 제대로 붙어있지 않은 낡아빠진 술집이었다. 번듯한 다른 곳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뭐 하러 이런 곳까지. 어느 모로 봐도 그간 봐온 레일린의 취향과 정반대로 다른, 바깥만큼이나 더욱 심란한 내부를 본 니아흐는 조금 질린 낯을 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레일린은 드물게 싱글싱글 웃고 있었다.
“내가 확실히 다시 온다고 했지. 방금까지 내기 한 놈들은 다 나한테 돈 내놓도록.”
“아, 안했거든요!”
“거기 빨간 머리는 입에 침이나 바르고.”
“같은 빨간 머리끼리 그러시기예요, 진짜!?”
다들 제법 안면을 튼 사이인지 말을 주고받는 것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다. 그런 중에 카운터 안의 청년이 우는 소리를 내자 그 주변으로 왁자지껄한 물결이 흘렀다. 그 한가운데로 자기 자리를 차지한 레일린이 멀뚱히 서있는 니아흐를 향해 제 빈 옆자리를 탕탕 두들겨보였다. 니아흐가 내키지 않는 걸음을 이끌어 자리에 앉는 사이, 레일린 옆에 앉은 은발의 나이든 엘프가 아는 척을 해왔다.
“이쪽이 얘기하던 그?”
“그렇지.”
“정말 취향이 바뀌긴 했군. 자네가 그렇게 오래 다른 이와 함께할 수 있는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걸세.”
“그걸 그쪽이 말하니 우스운데.”
겉보기로는 창창한 젊은 청년이 지긋하게 나이 먹은 어르신을 상대로 농을 치는 듯한 희한한 꼴이었다. 그럼에도 둘 사이에 어떤 어색함도 없으니 니아흐는 둘이 적당히 아는 사이려니, 하고 말았다. 레일린과 아는 사이라면 깊게 끼어드는 것도 사양이었다. 헌데 이상하게도, 일람이라면 질색을 하고 살아온 그에게도 저 엘프는 어쩐지 익숙한 듯한, 분명히 말해 낯이 익었다. 어디서 봤지? 결론을 내릴 뻔한 생각의 흐름을 끊어버리고 적당히 목만 축이려니 또 다시 안쪽 카운터에 선 빨간 머리 청년이 호들갑을 떨었다.
“뭐! 그럼 너도 쥐랑 대화하냐!?”
“얘가?”
어처구니 없는 말에 말문이 막힌 니아흐 대신 대답하는 것은 레일린이었다. 새로 술잔에 술을 가득 부어버린 그는 그것을 물마시듯 훌쩍 한입에 털어 넣으며 주절거렸다.
“얘는 못해. 고양이거든.”
“예?”
“…….”
“아니지. 곰이던가?”
레일린의 헛소리가 끝나기 무섭게 옆자리에서 작게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났다. 그것이 니아흐라고 웃음을 참는 소리라는 것을 못 알아들을 수 없었다. 기어이 레일린까지 풉, 하고 웃음이 전염되는 순간에 니아흐는 당장 망할 술병과 잔부터 빼앗아버렸다. 미친놈. 술이나 작작 처먹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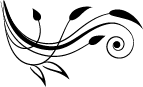
두더지님네 1차 세계관에 포함되어 있는 캐릭터가 이래저래 많아서 얘 얘기 해주세요! 쟤는 누구에요!! 썰 뜯어가는 절찬리 썰도둑 노릇을 할 적에.
이걸 써야겠다!! 생각할 즈음에 꽂힌 애는 빨간 머리―라고만 쓰게 된 루스였음.
루스는 바레쓰 할배의 귀여움을 받는 새끼쥐래~ 귀여워~
다같이 사이 좋아 보이지만 실상 루스만 정황을 모르고 니아는 어렴풋이 알았고 바레쓰는 그만 나가라고 억지 웃음 짓고 있고 린은 불청객으로 주저앉아서는 시시덕거리는 중. 못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