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게 대체 무슨 생고생이냐. 하지만 에란달은 이미 광산 안으로 발을 디밀고 난 이후였다. 망할 고용주만 아니었어도! 그러나 어쩌겠는가. 인베스는 가지고 싶은 건 꼭 가져야 성이 차는 사람이었고 에란달은 윗전이 까라면 까야 하는 충실한―부정할 길 없는―종신 피고용자인 것을. 그렇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젠장!
그러게, 애초에 그런 얘기가 인베스의 귀에 안 들어가게 막았어야 했다. 아니, 보상 얘기라도 안 나왔더라면! 에란달은 아주 뒤늦게 자신이 놓쳤던 문제점을 하나하나 일일이 들춰내면서 박박 이를 갈았다. 그놈의 돌덩이가 뭐라고!
‘광산에 벌레가 갑자기 출몰해서 채굴을 못한다니 아깝잖아.’
‘웃기지 마십시오. 그냥 내주겠다는 보상이 더 마음에 들어서겠지!’
‘그럼그럼. 여기서 나오는 보석 중에 제일 예쁜 걸 준다잖아. 응?’
‘……그런 눈으로 봐도 안 되는 건 안―.’
‘내가 직접 들어가면 위험하다고 말릴 테니까, 우리 에른 자기가 해주면 딱 되겠지?’
퍽이나.
퍽이나!
팔락거리는 부채 뒤로 들려오던 얄미운 목소리가 뇌리에서 재생되자마자 열이 확 뻗친 에란달은 발치에 보이는 돌멩이를 힘껏 걷어찼다. 때앵! 하고 저편의 벽에 맞고 튕겨나오는 소리에 옆에서 키득키득 웃는 인기척을 느끼고서야 그는 지금 자기 혼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 상기했다. 멋쩍음에 홱 뒤를 돌아보자 한 손에는 지도를 들고 있는 레크룩스가 하던 거 마저 하라는 듯 손을 살래살래 흔들고 있었다. 미치겠네! 에란달이 철로 된 투구로 머리끝까지 가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레크룩스는 뼈로 된 투구로 얼굴을 꽁꽁 가리고 있었으나 왜일까, 에란달은 그 아래 레크룩스의 표정을 쉬이 상상할 수 있었다. 왜겠어, 왜겠냐고!
“그렇게 빤히 안 쳐다봐도 네 고용주한테 안 까발린다.”
“누가 뭐랍니까!”
괜히 찔끔한 에란달이 빽 소리를 질렀다. 성큼성큼 앞서 걷는 그의 등을 향해 레크룩스가 그 방향 아닌데, 라고 한 마디 툭 던졌다. 그새 여섯 걸음은 앞서 걷던 에란달은 씩씩거리며 돌아가야 했다. 대체가. 아무리 그 통로가 그 통로같아도 에란달이 보기에는 이 길도 한 3번은 걸은 것 같았다. 애초에 이쪽 길은 맞나? 에란달은 어딘가 미심쩍은 눈으로, 그러나 그렇다고 크게 티내지 않는 정도에서 레크룩스가 지도를 한참 들여다보는 모습을 쳐다보았다. 레크룩스의 이번 동행은 인베스가 길잡이 안내역으로 억지로 붙여준―당연히 그 둘 사이에서도 사전 합의는 일절 없었다―것이었다. 처음 들어가는 거고, 갱도가 복잡하고, 어쩌구어쩌구하는 이유로. 그러나 이러니저러니해도 에란달은 영 마뜩찮았다. 제대로 아는 건 맞는 건지. 그는 입 밖에 내선 안 되는 말을 속마음이라고 마구 내뱉었다. 그러나 제아무리 서로 투구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한들 뻔한 일을 모를 위인이 아니었다.
“얼굴 뚫리겠어, 아주?”
“자의식 과잉 아닙니까? 그렇게까진 안 쳐다봤거든요?”
“‘그렇게까진’ 아니어도 쳐다보긴 했다는 거네. 아니야?”
뭔 말을 못하지 진짜! 에란달은 금세 또 혼자 괜히 활활 타올랐다. 눈앞의 저 던머나 바깥에 있는 그 던머나 아주 그의 속을 박박 긁는데 도가 튼 인물들이었다. 그리하여 그의 직접적으로 풀 수 없는 울분을 그나마 해소해줄 수 있는 것은 길가에 널린 애꿎은 돌멩이들 뿐이었다. 따악 딱 돌멩이들이 이리저리 발에 채여 구르는 소리 속에 희미하게 숨죽인 웃음소리가 섞여 들리는 것을 에란달은 이번에도 느리게 알아챘다. 머리끝까지 차오르던 열이 이제는 귀끝까지 치솟았다. 지레 찔린 그가 멀쩡히 잘 쓰고 있던 투구를 꾹꾹 누르며 고개를 홱 돌렸을 때, 타이밍 좋게도 레크룩스는 지도에 거의 코를 박을 듯이 머리를 들이대고 있었다. 그렇다고 지도가 잘게 흔들리는 어깨까지 가려주는 것은 아니어서.
“거, 그냥, 웃으시던지.”
“아. 이제 좀 웃어도 되냐?”
“언제는 제 허락 받았습니까!”
에란달의 화려한 자폭에 끝내 레크룩스는 크게 어깨를 들썩거렸다. 에란달은 그저 당장 이곳에 인베스까지 있지 않음을 다행으로 여기기로 했다. 그래, 그거라도 어디냐! 그는 밑바닥을 긁어서까지 위안거리를 찾으려는 제 정신을 굳이 붙잡지 않았다. 몇 번인가 심호흡을 하는데 집중을 쏟으려니 통렬하게 흔들리는 보랏빛 어깨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간헐적인 떨림마저 완전히 멎는데는 그보다 한참 더 걸렸다.
“하, 아무튼. 대충 길은 감이 왔고. 우리는 여기즈음에 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주욱 가면 되겠어.”
“…….”
아까까지도 아무 일 없었던 양 레크룩스는 퍽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 뻔뻔함에 에란달은 심히 마뜩찮은 표정을 지었으나 괜히 그가 나서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었다. 대신 불퉁하게 튀어나온 입이 제멋대로 말을 내뱉고 말았다.
“그 길은 맞습니까?”
“…….”
앞서 가려던 레크룩스의 걸음이 뚝 멈췄다. 홱 돌아보는 그를 에란달이 뚫어져라 보고 있으려니 문득 말 한 마디가 툭 날아왔다.
“그럼 우리 기사 나리께서 먼저 가시지.”
“웃기지 마시죠! 그럴거면 왜 같이 옵니까, 나 혼자 들어왔지?”
“우리 기사 나리께서는 방향치잖아. 나는 길치.”
“이 사람 진짜 뭐라는 거지. 떨어지십쇼.”
레크룩스가 바짝 가까이 다가와서는 사람 복장을 뒤집는 소리를 해댔다. 또 사람을 놀리지! 대번에 질색을 한 에란달이 팍 레크룩스를 밀쳐냈다. 아야. 조금도 타격 없는 목소리로 아픈 척 해봤자였다. 에란달은 레크룩스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영 발소리가 하나 나지 않아 그는 신경질적으로 돌아보았다.
“대체 여기 하루 종일 있을……?!”
돌아본 자리에는 레크룩스가 고개까지 푹 수그리고 주저앉아있었다. 아니, 진짜로? 갑자기 당황스러워진 에란달이 서둘러 레크룩스에게 다가가 어깨 위로 손을 올렸다. 손이 닿는 순간, 갑작스레 레크룩스의 팔이 무섭게 달라붙어 에란달을 붙잡고 늘어졌다.
“나 이제 못 일어나. 책임져.”
“뭐라는 거야 진짜! 헛소리 할 기력 있으면 일어나기나 하십쇼!”
“응 못 일어나.”
“여기서 평생 눌러 앉아있을 거 아니면 퍼뜩 일어납시다.”
“그거도 괜찮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끝내 에란달이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다. 실컷 놀려먹을 만큼 놀려먹은 레크룩스의 어깨만 한없이 가벼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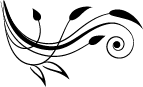
던전을 도는데 방향치도 겸하는 후레탱커 (나) 는 두더지님께 길안내를 맡겨버렸고 (
처음 던전에서는 두더지님도 같이 잠깐 숏컷 루트를 해멨는데……내가 거기다 대고 더 괘씸한 발언을 일삼았고―에 믿었는데 이거 안되겠네요!―플레이하는 캐릭터가 나는 플린이었고 두더지님은 아킨이어서 더 했음. 두더지님은 나갈래!! 를 시전하셨음 ㅋㅋㅋㅋㅋ 그치만 헤매신 건 초반만이었고 다음에는 호딱호딱 지나갔음.
그 다음 던전에서는 좀 더 익숙해서 두더지님이 샥샥 길을 잘 찾아내셨음. 이때는 캐릭터 바꿔서 나는 에른 두더지님은 레구였던듯. 아닌가? 에른 아니었을지도. 레구는 확실함.
나 : 두더지님 믿고 있었다구!
두더지님 : 아깐 겁나 뭐라고 하셨으면서.
나 : 에이 아까는 아까고 지금은 지금이죠.
대충 이런 대화하다가 아 이거 글로 써먹어도 되겠다!! 싶어서 슈루루룩…..원래는 던전 전투도 써야 하겠지만 쓰고 싶은 부분 다 써버린 글러먹은 글러는 늘어져버렷다네~
+ 레구 캐해 잘못한 부분 있어서 발견한 김에 고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