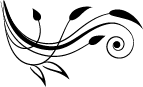필라스는 문 밖에서 우당탕 발 구르는 소리를 듣고 읽고 있던 책에서 눈을 뗐다. 아퀼라가 저녁을 먹자마자 어딘가 나가버린 듯하더니 이제야 들어온 모양이었다. 자정을 조금 지나 어느덧 오전 2시 30분. 침실 탁자 위에 올려둔 시계에 흘끗 시선을 던진 필라스는 읽던 책도 덮어버렸다. 뭘 잡아왔건, 아퀼라는 양손 가득 들고 온 전리품을 주방 어딘가에 던져두고서 곧장 또 뛰어올라올 것이다. 나 추워!! 따위를 외치면서. 그 다음에는 책이 아무 소용도 없게 될 터였다. 대충 눈에 띄는 것을 사이에 끼워 놓고 시계 옆에 책을 내려놓은 그는 신발을 벗어두고 침대에 올랐다. 이불을 덮고 있자니 있는 줄도 몰랐던 한기가 조금 멀어지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나풀거리는 하얀 머리카락들을 대충 정돈한 그는 짧게 한숨을 내뱉었다. 보지 않아도 바깥의 풍경이 쉬이 상상되는 까닭에.
바깥에서는 부지런히도 날다람쥐가 나무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듯 가볍게 계단이 쿵쿵 밟히는 소리, 세차게 문이 여닫히는 소리. 또다시 쿵쾅쿵쾅 발걸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는 아니나 다를까 필라스가 쓰는 침실 문이 활짝 열렸다. 차게 얼어붙은 밤공기에 깊은 수풀의 냄새가 섞여 방 안에 스며들었다.
“** ** * 개추워!”
“문이나 닫아라.”
익히 예상한 말에 필라스는 대충 대꾸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문이 쿵 닫히고, 침대 위는 한 사람 분의 무게가 더해져 가볍게 흔들렸다. 두툼한 이불이 아퀼라의 손아귀에 속절없이 끌려가 필라스의 위로는 얇은 홀겹 이불만 남았다. 필라스는 슬쩍 일어나 앉았다. 석류색의 눈이 오늘도 둥글게 부풀어 오른 이불 고치를 째려보았다.
“야. 나는?”
“잘 거야?”
“아니.”
“근데 뭐 **.”
이불 고치 밑으로 샛노란 금발이 삐죽 나오더니 이내 그 사이로 감람색 눈이 흉흉하게 번뜩이는 게 보였다. 어디 가져갈 거면 가져가 보라는 듯이. 확 걷어차 버릴까. 요 며칠 동안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고민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필라스는 입술을 씰룩거렸다. 그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성난 이불 귀신은 도로 고치 속으로 쏙 들어가 사라졌다. 저렇게 추워하면서 이 시간까지 어딜 헤매고 다닌 건지. 쯧, 혀를 한 번 찬 필라스는 도로 베개를 베고 누웠다.
“누울 거면 똑바로 눕던가. 자리가 좁아지잖아.”
“네가 쓸데없이 *** 커서 그렇잖아. 반으로 줄여.”
“뭐라는 거야, 미쳤냐?”
“악! 차지 마! ** 이게 어딜!”
“내려가, 바닥에서 자.”
“네가 내려가! 자리만 *** ** 차지하는 게!”
필라스가 몇 번 고치를 퍽퍽 발로 차댔다. 그 행동은 이불 고치 속 이불 귀신의 화를 단단히 샀다. 아퀼라 그린우드의 얼굴을 한 이 귀신은 이불을 확 펼쳐서는 그대로 필라스의 위를 덮치며 온몸으로 덤벼들었다. 그렇다고 그냥 당해줄 필라스 레이븐크로프트가 아니었다. 이불이고 뭐고 한 덩어리가 되어서는 둘은 용케 침대 위에서 떨어지지는 않고 다만 데굴데굴 구르며 서로를 잡아 뜯고 걷어찼다.
“이게, 성질머리만, 더러워서!”
“너는 뭐……** 착한 줄 알아?!”
“성질 곱게 써야 키 큰다는 얘기 못 들었냐?”
“키 얘기 하지 말랬다, 이 **** 박쥐 새끼야!”
아퀼라의 성난 기세에 침대의 끄트머리까지 몰린 필라스가 어쩔 수 없이 침대에서 훌쩍 멀어졌다. 순식간에 벌어진 거리에 아퀼라가 씩씩거리며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내던지기 시작했다. 베개에 책에, 기어이 던질 게 없어지면 껄끄러운 것까지―이를테면 마력으로 빛나는 하얀 구체―던질까 하여 필라스는 되도록 잽싸게 바닥으로 추락하는 물건들을 걷어내듯 집어 도로 침대 위로……아퀼라를 향해 던졌다. 아퀼라는 매우 고까워하며 더욱 세게 물건을 집어 던졌고.
한참을 부질없이 물건들만 허공을 가로질러 질주했다. 털썩 하나가 자기 앞에 떨어지면 반사적으로 내던지길 반복하다 손 안에 차갑고 질척한 것이 떨어져 필라스는 지레 질겁했다.
“악! 이건 또 뭐야!”
“귤 처음 보냐, **** ** *** 머저리야!”
“겠냐! 이게 왜 여기 있냐고!”
아퀼라는 질겁하는 필라스의 표정을 따라하며 한껏 비웃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필라스는 손 안에 떨어진 귤의 상태를 보고 얼굴을 더 구겼다. 둘이 구를 때 어디에 단단히 끼이긴 했던 듯 귤이 조금 으깨져 안에 고여 있었을 과즙으로 흥건했다. 그 과즙이 저 웬수같은 놈의 옷에 흡수가 된 것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이불은 안 돼! 필라스가 창백한 낯을 더 하얗게 굳히자 아퀼라도 덩달아 조금 긴장한 얼굴을 지었다.
“왜 그러는데?”
“귤 더 갖고 있어?”
“주머니 안에?”
“이불 빨래는 네가 하냐? 이 끈적거리는 걸 갖고 침대 위에서 뒹굴게!”
필라스가 세차게 일갈하자 아퀼라는 눈을 새초롬하게 떴다. 딱히 반성한다는 건 아니고, ‘또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이 난리를 쳐?’ 에 가까운 감상일 뿐이다. 석류색의 시선과 감람색의 시선이 다시 맞붙었다. 이번에는 침대로 뛰어드는 필라스의 선공으로 2차전이 발발했다. 퍽퍽 매섭게 파찰음이 울릴 정도로 주먹질에 드잡이질까지 하고 나서, 승패의 결과는 각자 본인이 이긴 거라고 우겨대기까지 20분도 걸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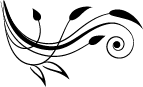
“아직 멀었냐?”
“다 됐잖아. 더 뭘 하라고?”
“하나하나 떼 줘야 할 거 아니야. **같이 센스도 없기는.”
온갖 푸닥거리를 한 다음에, 공중을 한참 오간 물건들도 제자리에 돌려놓고서. 아퀼라와 필라스는 겨우 침대에 나란히 누울 수 있었다. 그대로 잘 줄 알았더니, 아퀼라는 필라스에게 으깨지고 뭉개진 귤을 까달라며 성화였다. 필라스로 말하자면, 칼을 대기도 뭐한데다 누르기만 하면 끈적거리는 과즙이 줄줄 새서는 손을 물들이는 과일이란 영 마뜩찮았다. 사과 같은 건 그냥 쪼개기라도 하지. 게다가 이미 다 터진 건 말해 뭐하겠는가. 그럼에도 해주지 않았다간 아퀼라가 밤새도록 종알거릴 기세라, 필라스는 느릿느릿 귤의 껍질을 떼어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하나 알갱이를 나눠달란다.
“네 손은 뒀다가 국 끓여먹게?”
“고작 한 번 먹는 걸로 쓰기에는 내 손이 너무 귀하지.”
“뭐라는 건지.”
“입을 놀리지 말고 손을 써서 *** 빨리 귤이나 까라.”
“시끄러워.”
아퀼라는 필라스가 귤을 까는 족족 얄밉게 입으로 쏙쏙 넣었다. 우물우물 귤 알맹이를 씹으면서도 요구사항이 끊이질 않았다. 거기 하얀 거 덩어리로 남아 있잖아. 그건 너나 처먹어. 안에 하얀 거도 떼야 할 거 아니야. ** 껍질을 그렇게 통째로 뜯어내면 되냐? 손재주는 대체 언제 기를 거야? 조잘조잘 떠드는 입이 괘씸해 필라스는 가끔 하얀 속살이 두껍게 붙은 알맹이도 아퀼라의 입에 쏙쏙 넣어버렸다.
“**** ** ***. 야!”
“너 다 먹어.”
“이게!”
“많이 먹어야 키 크지.”
꽃 모양으로 활짝 펼쳐진 귤껍질이 겹겹이 포개지길 다섯 장, 여섯 장이 되도록. 이불 밑에서는 서로를 밀어대는 다리들의 싸움이 치열했다. 이윽고 이불이 들썩이는 소리가 잦아들 즈음에는 씩씩거리는 숨소리도 점차 고르게 바뀌어 나른한 고요함이 안식처럼 깔렸다. 고요한 침대를 내버려둔 채로, 필라스는 마지막으로 남겨두었던 화등도 훅 꺼뜨렸다. 끈적이는 손을 부러 꼼꼼하게 닦았지만 어째서인가 여전히 손끝에는 여전히 들러붙는 감각이 배어있었다. 단단히 물들어버린 것처럼. 냄새는 벌써 사라져버렸는데, 이상한 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