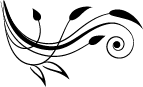필리아 레이븐크로프트는 꼼짝없이 침대에 갇혀 있었다. 다행히도 그에게는 아직 책을 읽을 정도의 자유는 남아있었다. 침대의 헤드보드에 기대앉아서, 쭉 뻗고 있는 다리 자세를 고쳐보려다 그는 허벅지 위로 무언가 걸리적거리는 무게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시선을 내려 보면 필리아를 밤새 침대에 가둬두는 침대의 지박령이 누워있었다. 요 며칠 밤에 나가지도 않고 그를 붙잡고 늘어지는 아퀼라 그린우드가.
“그 책 재미있냐?”
책 너머에서 빤히 쳐다보던 아퀼라가 물었다. 감람색 눈동자가 호기심으로 반짝거렸다. 그러나 그쪽으로는 시선조차 옮기지 않은 필리아는 무미건조하게 페이지를 팔락 한 장 넘겼다. 무심한 석류색 눈은 책에서 떠날 줄 몰랐다.
“책을 재미로 읽나.”
대답까지 해줬건만,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아퀼라는 대뜸 책을 잡아채더니 이래저래 흔들어댔다. 급기야는 필리아의 손에서 빼앗아 들기까지. 그러더니 표지만 이리저리 살펴보는 게 아닌가. 야! 필리아는 짜증스럽게 팔을 뻗어 책을 도로 가져오려고 했지만 아퀼라는 잽싸게 몸을 홱 굴려 멀찍이 떨어졌다. 라고는 해도 여전히 그의 건방진 뒤통수는 필리아의 허벅지 위에 철썩 붙어있긴 했으나.
“대체가. 뭘 하자는 건데?”
“네가 ** 책만 가만히 읽으니까. 이게 뭐가 재미있는데? **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너 때문에 어제도 다 못 읽었다.”
“그러게 누가 책만 *** 읽으라고 했냐고.”
시큰둥하게 대꾸하던 아퀼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렇게나 책을 내팽개쳤다. 돌연 날아오는 책에 안면을 정통으로 맞을 뻔한 필리아는 어찌저찌 책등이 코뼈를 눌러버리기 전에 잡기는 하였다. 이걸 진짜 콱. 필리아가 사납게 치켜뜬 눈으로 째려보건 말건 아퀼라는 내내 딴청을 부렸다. 필리아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평생 이해 못할 저 작은 머리통을 조금 온건한 방법으로 골려주기로 마음 먹었다. 다리를 들썩들썩 흔드는 정도면 충분하리라.
“야. 말, 똑바로, 하라고.”
“악! ** 야!! ** *** ** 멀미난다고!”
“알 게 뭐야. 너부터가 말을 제대로 안 하잖아.”
다리를 들었다 놓았다 하니 머리도 통통 튀듯 튀어 올랐다. 짧게 잘린 금발도 그에 맞춰 하늘하늘 흔들리며 반짝거렸다. 이거 괜찮은데. 필리아가 히죽거릴 때 벌떡 몸을 일으킨 아퀼라가 괴성을 지르며 덤벼들었다. 그러나 다른 때면 모를까 지금의 필리아는 아퀼라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묘하게, 아퀼라가 지금 모습에 약해진다는 인상을 어렴풋하게 느꼈다. 하여 필리아는 아퀼라가 주먹을 들었어도 몇 번인가 어깨나 가슴께를 향해 닿을 듯 말 듯 헛손질을 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에 그리 놀라지 않았다. 그가 제 위를 차지하고 털썩 엎어지는 것은 제법 곤란했지만.
“무겁다. 내려 가.”
“싫은데. 안 놀아준 벌이야.”
“별…….”
끌어내리기도, 밀쳐내기도 애매해진 손으로 머리나 받친 필리아는 천장의 무늬나 일없이 헤아리듯 먼눈으로 바라보았다. 허벅지에서 느꼈던 익숙한 무게감이 이제는 가슴 위를 누르고 있었다. 그가 숨을 들이쉬고 내뱉는 것에 맞춰 아퀼라도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 어딘가 멀게 느껴질 즈음에.
“잘 거면 내려가라.”
“쳇.”
“쳇 같은 소리 하네. 네 방으로 가던가.”
“그럼 자기 전에 귤 먹을래. 귤 또 까줘.”
“금방 잘 거면서 뭘 먹어 먹기는! 그냥 자!”
“싫어!”
** 귤 가져와. 귤 까줘! 떼 쓸 거리가 하나 생기자마자 아퀼라는 귀신같이 필리아를 붙들고 늘어졌다. 어린애가 잠투정을 부리듯 생떼를 부리며 난동을 부리자 필리아는 손쓸 도리도 없이 끔찍한 기분을 실컷 맛보았다. 특히나 아퀼라가 그의 길고 가는 하얀 머리칼을 양 손에 한움큼씩 붙들고 목덜미와 어깨 사이에 얼굴을 파묻어서는 빽빽 소리를 질러댈 때 정말이지 더할 나위 없이 밉살맞게 느껴졌다. 미치겠네. 필리아는 질끈 눈을 감았다.
“알았으니까 내려가, 꺼져!”
“많이 갖고 와. *** 많이.”
“얼마나 먹으려고. 조금만 먹어.”
아퀼라를 팍 밀쳐낸 필리아가 질색을 하며 몸을 일으켜 방을 나설 때까지, 아퀼라는 시종 히죽히죽 웃으며 필리아에게 팔랑팔랑 손을 흔들어주기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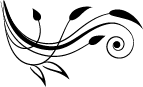
“하나 더 까줘.”
“그만 먹으라니까. 자다가 화장실 가고 싶냐?”
“갈 때 가더라도 내가 가는 건데 네가 뭔 상관이야? 얼른 더 까줘.”
두꺼운 이불에 푹 파묻혀 있는 아퀼라가 필리아의 옆에서 데굴 구르며 팔을 멋대로 베고 누웠다. 순간적으로 한쪽 팔이 푹 내려간 탓에 필리아는 하마터면 까던 귤을 놓칠 뻔했다. 그는 무심결에 짜증 섞인 욕설을 입에 담았지만 아퀼라는 그것을 못 들은 척 했다. 하여간 입이나 행동이나 싸가지가 아주 그냥. 필리아는 까기 무섭게 입으로 홀랑 가져가는 주제에 말은 고약하게 내뱉는 고얀 입을 콱 꼬집어주려다가 침대 옆 협탁 위에 남아있는 귤 하나를 더 갖고 왔다.
벌써 6개째였다. 필리아의 손톱 밑도 이미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끈적거리기는 덤으로. 필리아는 우거지상을 쓰고 귤껍질을 최대한 부드럽게 떼어내기 시작했다. 끈적거리지, 번거롭지, 부스러기는 또 얼마나 떨어지는지. 이런 게 뭐가 좋다고. 속으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투덜거림을 쏟아내던 필리아는 번뜩 딴생각을 떠올렸다. 귤 같은 품종은 사시사철 날이 후덥지근한 지역에서만 키울 수 있다는 걸 얘기하면 어떨까?
그러나 그 생각도 잠시였다. 놀리는 것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해야지. 그렇고말고.
“귤 까다 말고 왜 혼자 히죽거리냐?”
“……들으면 네가 펄쩍 뛸 만한 생각.”
“허어. 어디 한 번 들어나 보자. 뭔데?”
“됐고 이거나 먹어.”
필리아는 때마침 손질이 끝난 귤을 통째로 아퀼라의 입에 쑤셔 넣었다. 대번에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듯 크게 눈을 뜬 아퀼라가 그대로 욕을 퍼붓듯 노려보았지만 필리아는 그것을 못 본 척 했다. 그러게 누가 사람 귀찮게 지지고 볶으랬나. 자업자득이었다. 간신히 과즙 한 방울 안 흘리고 귤을 씹어 삼킨 아퀼라가 복수다! 따위를 외치며 필리아에게 다시 덤벼들었다. 징그럽게! 떨어져! 필리아가 얼마나 소리를 지르건 아퀼라는 필리아의 품에 찰싹 들러붙어서는 떨어지지도 않았다.
“이 거머리 같은 게. 떨어지라니까!”
“배부르고 졸리니까 잘 거거든. 순순히 베개나 되라.”
“멀쩡한 베개 두고 헛소리는.”
“잘 자.”
아퀼라는 고개까지 아예 필리아의 품에 푹 처박고서 코 고는 시늉까지 했다. 환장하겠네 진짜. 필리아는 제 등까지 철썩 들러붙은 아퀼라의 팔도 차마 쳐내지 못하고 굳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가 그러거나 말거나 아퀼라는 의도적으로 자는 척 숨소리를 내다가 금세 정말 그대로 곯아떨어졌다. 귤 껍질을 잘못 씹은 듯한 떫은 맛 가득한 하루의 마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