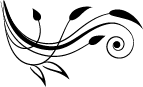당신이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 좋겠다 (22/11/28)
(이전의 내용 : ▶)
아르카비스는 본인의 임무가 실패했음을 이미 알면서도 기존의 생활을 청산하지는 못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평소처럼 뺀질나게 손님으로 드나드는 에쉬레스토 탓으로. 마치 저번 주의 일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그는 여전히 아르카비스가 일하는 주점으로 찾아왔고, 여전히 아르카비스에게 수작질을 부렸다. 낮에는 각자의 위치에서, 교정에서 마주친다 해도 데면데면하게 구는 주제에. 어스름이 깔리는 시간부터는 뻔뻔하게 들러붙는 것이다. 누구를 우습게보고. 아르카비스는 분명 별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4시에 약속을 잡으면 3시부터 기대하고 만다는 어떤 어린 여우처럼.
아르카비스는 시계로 향해버리는 제 몸짓을 멈출 수 없었다. 당연한 것처럼, 초침은 7에 가까이 다가붙어 있었고 분침은 59와 00의 사이에 걸려 있었다. 그러면 곧 문에 걸어놓은 종이 딸그랑 소리를 낼 것이고, 익숙한 인사가 들릴 것이다.
“자리 있어요?”
“…….”
솔직한 심정으로는 없다고 내쫓아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런 대담한 거짓말을 치기에 주점 안은 여전히 한산했고, 피크 타임은 좀 더 나중 시간대에나 찾아올 터였다. 아르카비스는 잔의 물기를 닦는 작업을 멈추지 않은 채로 턱짓으로 대충 빈자리들을 가리켰다. 굳이 창가 자리를 가리켜도, 에쉬레스토는 항상 바텐더와 가장 가까운 바 테이블 자리에 앉았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르카비스의 앞자리에 덜컹 자리를 맡은 그는 뻔뻔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목이 마르더라고요.”
“주문하시는 건 얼음물, 맞으십니까?”
“오늘도 차갑기 그지없네요.”
에쉬레스토는 전혀 유감스럽지 않은 얼굴을 하고 말했다. 생각해보면 그는 요 며칠 간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할 것을 알면서도 굳이 찾아오는 것이긴 했다. 찾아오지 않으면 어련히 알아서 떠날 것을 부득불 잡는 것도 이상하지. 아르카비스는 뽀득뽀득 잔을 부드러운 천으로 문지르며 생각에 잠겼다.
그건 분명 에쉬레스토가 할 법한 일은 아니었다. 누군가를 붙잡는 것 같은 짓거리는. 그렇지만. 지금 이런 행동들은 대체 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아르카비스는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었다. 천이 유리를 스치며 나는 끽끽거리는 소리도 어느덧 멎은 상태였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누구 때문에, 아니. 손님과는 상관없습니다.”
에쉬레스토가 짓궂은 질문을 던지는 바람에 아르카비스는 순간적으로 속절없이 휘말려 들어갈 뻔했다. 그가 짐작하는 한, 에쉬레스토는 자기에게 향하는 관심을 백배쯤 부풀려서 의미를 두는 사람이었다. 괜히 이쪽에서 밑지는 사유를 만들어줄 필요는 없었다. 그러니, 아르카비스는 쏟아낼 뻔한 감정을 겨우 닫았다. 간신히 닦고 있던 잔을 내려두는 찰나에.
마주치는 주홍빛 눈동자가 슬며시 휘어지는 것을 못 본 척 할 수가 없어서.
“너는 어떻게 그래?”
라고 기어이 말해버리고 말았다. 그 목소리는 숫제 억울하게 들릴 지경이었다.
“갑자기 뭐가요?”
“너는 꼭! 그 때 일이……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구니까!”
말하고 나서 아르카비스는 혀를 깨물 뻔했다. 이래서야 무슨, 고백도 제대로 말하기 전에 차인 사람 같지 않은가. 그들이 나눈 것은 그보다 더 짙은 관계긴 했어도. 하지만 이래서야 꼭, 기대를 배신당한 연인 같지 않은가. 그들이 나눈 것이 비록 하룻밤 일로 끝났다 한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요?”
“…….”
분명 그리 싱겁게 끝났을 텐데. 그럼에도 아르카비스는 평소와 다른 에쉬레스토의 모습에 적잖이 놀라버렸다. 항상 가볍고 진지해보인 때가 없던 그의 얼굴이 무척이나 깊게 가라앉아있어서. 아르카비스는 홀린 듯 에쉬레스토를 가만히 볼 수밖에 없었다.
“매일같이 차이고, 무시 받으러 오는 게 과연 저한테 쉬운 일이었을까요?”
“…….”
“하지만 하루라도 오지 않으면, 당신이 사라져 버릴 테니까. 사라진 사람의 뒤를 쫓는 것보다 옆에 두고 있는 게 더 나으니까.”
“하지만 네가 그동안……!”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날 당신이 잘 했다고? 듣기 좋게 울어줬다고?”
에쉬레스토가 가감 없이 내뱉는 말에 아르카비스는 순식간에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다. 귀까지 홧홧하게 달아오르는 것을 참지 못하고, 그는 저도 모르게 에쉬레스토를 향해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던지고 말았다. 아차한 후에 깨달은 것이지만 그것은 아까까지 컵의 물기를 닦고 있던 행주였다. 그 옆에는 사람의 머리에 직격하면 더 큰일이 날 물건들이 즐비했으므로 아르카비스는 조금 안심하기로 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감정이 누그러지나 하면 조금도 아니고.
“내 말은.”
“…….”
“그러니까…….”
우물쭈물하기 시작한 아르카비스를 앞에 두고, 에쉬레스토는 팔짱을 끼고 비스듬히 서서 바라보았다. 그가 꺼낼 말이라는 것도 알 만한 범주 안이었으므로 못 기다릴 것도 아니었다. 무엇보다 고지식하기 그지없는 그의 성격 상, 통상적인 연애였다면 상대에게 기대할 수 있을 법한 일종의 ‘사후 관리’ 를 바랐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직접 말로 표현하지 않은 이상, 타인의 소망은 에쉬레스토에게 알 바가 아니었다. 설령 손에 넣고 싶은 사람이어도 원하는 것을 다 퍼주는 짓은 호구나 할 멍청한 짓거리니까.
그래. 이건 본격적으로 관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반드시 해두어야 할 질서 정립이었다. 애써 줄 거 다 줬더니 그 헌신이 무용하게 증발해버리는 것은 사양이었다. 사람 관계가 항상 기브 앤 테이크는 아닐지언정 투자 대비 효율은 있어야지. 덫을 깔고 사냥감이 다가오는 때를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에쉬레스토는 배부른 맹수의 눈을 하고 아르카비스를 지긋이 쳐다보았다.
“네가 그 날 이후로도, 내가 아무 존재도 아닌 것처럼 대하니까.”
이것 보라지. 벌써부터 자기의 패를 다 까버리는 허술한 꼴이라니.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대답에 에쉬레스토는 그저 고개만 한쪽으로 기울일 따름이었다. 이러고도 이 사람 어떻게 여태껏 남의 뒤를 캐는 일을 해왔을까. 그동안 맡은 일이 죄다 더 허술한 사람을 대상으로만 했던가, 아니면, 아니면……뭐든 아무려면 어떤가. 저 허술한 먹잇감이 맛있게 그의 앞으로 굴러 떨어진 것이 중요했다. 아직까지는. 아니 앞으로도. 평생토록.
당신이 내 옆에서 계속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겠어.
비죽 새어나올 뻔한 비웃음을 어렵지 않게 갈무리 하며 에쉬레스토는 가볍게 어깨만 으쓱했다. 아르카비스가 그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눈을 찌푸렸다. 아, 불쌍한 당신. 안타까운 사람. 차라리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고 도망치는 게 더 나았을 것을. 괜한 치기에 빠져 얼쩡거리다 스스로 발이 빠지다니.
이건 전부 당신의 잘못이야. 이번에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럼 우리, 연애할까요?”
“뭐?”
“책임져 달라는 거잖아요. 저 잘해요, 그런 거.”
당신이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오로지 내 방식으로. 절대 풀어주지 않을 새장에 담아서. 아마도 꿈꾸던 사랑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자기 눈에 띈 그의 잘못이어서. 에쉬레스토는 아무런 저항 없이 아르카비스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그대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바 뒤에 서 있는 그에게 며칠 전의 키스를 다시 건네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