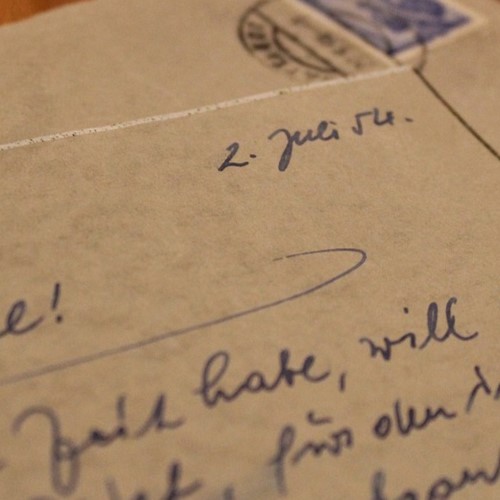다니엘은 몽롱하게 자기를 스쳐 흘러가는 감각들을 느꼈다. 꿈인 듯. 현실인 듯. 흔들리는 것은 자신인 듯. 아니면……. 따스하게 닿는 온기는 분명 살갑지는 않았지만.
‘허약하기 짝이 없어.’
“헉……!”
다니엘은 거의 경기하듯이 벌떡 몸을 일으켰다. 눈앞에 들어오는 것은 두 달 동안 충분히 눈에 익은 익숙한 벽과, 익숙한 천장의 무늬. 전에 쓰던 것보다 더 부드러운 감촉의 침구들과 화려한 가구들. 그는 마치 악몽이라도 꾸고 일어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주위를 휘휘 둘러보았다. 아무리 쳐다보아도 모든 것이 어제와 다르지 않았다.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번잡한 마음은 갑작스러운 시종의 부름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다.
“부인? 일어나셨습니까?”
“어……!”
차라리 자는 척이라도 할 것을. 애매하게 인기척을 내어버렸다. 다니엘은 황망하게 이따 다시 오라는 말을 꺼내려다 그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는 목을 붙잡았다. 아닌 게 아니라 말이 아닌 숨이 드나들 때조차 따가워 여간 아픈 것이 아니었다. 꺽꺽 숨을 몰아쉬는 와중에 문이 벌컥 열리고 말았다. 연이은 상황에 사고가 도무지 따라붙지 않는 다니엘은 부리나케 이불만 끌어당겨 몸만 겨우 가렸다.
“부인. 이른 시간에 갑자기 찾아와 대면조차 못하고 전달하는 무례를 먼저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괜찮, 습니다.”
다행히도 시종은 방 안으로 들어올 생각은 없는 것 같았다. 다니엘은 허둥지둥 이불을 들추어 제 모습을 잠시 살폈다. 흔한 여성용 잠옷인 네글리제 차림인 것을 빼면 당장 누군가가 들이닥친다 해도 그리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았다. 단지 그가 기억하는 제 마지막 차림새는 이 옷이 아닌 게 문제였다. 언제, 누가 갈아입힌 거지?
“제가 가고 나서 시녀들이 도착할 것입니다. 치장을 마치고 나면, 같이 식사를 들자는 주인님의 전언이 있었습니다.”
주인님. 그 말에 불현듯 다니엘의 뇌리에 잊고 있던 어제의 사건이 떠올랐다. 같이 식사라니. 설마하니 마지막 식사는 친히 같이 먹어주겠다는 건가? 오만 생각에 이불을 쥔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