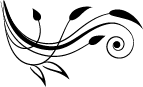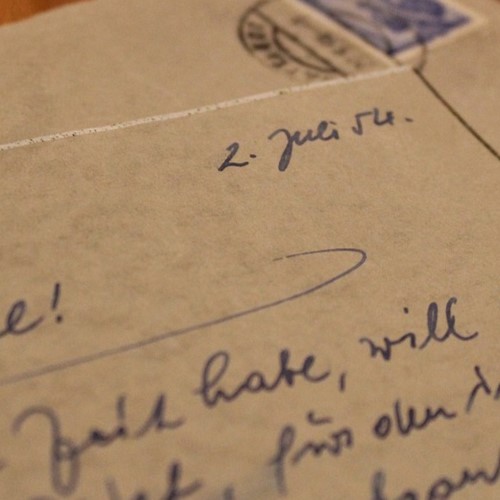살면서 이만큼이나 격한 생명의 위기를 느낀 적이 있었던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매우 빠르게 튀어나왔다. 26년의 인생을 걸고. 결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이나 한가롭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니엘 비센베르크는 한편으로는 심히 넋이 나가있었다.
“주인님!”
“웬 수상한 놈이 저택 안까지!”
양 옆에서 시끄럽게 우짖는 목소리만 반으로 줄어도 한결 나을 것 같았다. 둘이서 사람을 꼼짝도 못하게 팔 한 짝씩 부여잡은 채로. 그보다 일단 수상한 사람도 아니라고요. 다니엘은 골이 지끈거렸다. 상황이 이렇게 꼬일 수가 없었다. 하늘하늘한 드레스도, 하다못해 예식 때 쓴 그놈의 장신구 하나도 걸지 않은 지금의 다니엘에게는 ‘이 저택의 주인 푸른 수염에게 시집 온 아멜리 비센베르크의 존재와 동일하다’ 는 논제를 증명할 길이 없었다. 평소에 입는 것과 비슷하게 구한 남성용 정장에, 이제는 허리께까지 닿는 금발을 하나로 질끈 내려 묶은 모습으로는 그야 누가 봐도 훌륭한 남자로 보이겠다. 당연하게도 남자로서의 다니엘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걸려도 하필이면 왜 정문에서 어물쩍거리는 걸 들켰을까. 이제와 한다는 후회도 당장의 꼬락서니처럼 형편없었다.
한밤중에 어깻죽지까지 바싹 붙들려 질질 끌려다니는 처량한 몰골은 두 달 전에 근사한 마차에서 내려 따스한 햇빛 속에서 정중한 에스코트를 받았던 것과 심히 대조적이었다. 다행히도 다니엘에게 그 차이에 대해서 곱씹어볼 틈은 주어지지 않았다. 푸른수염에게 충실한 하인들은 다만 주인의 위치는 알지 못하는지 저택의 온갖 곳에서 그를 부르짖으며 찾아 해메기만 했으므로. 망할. 다니엘은 입술을 꾹 깨물었다. 차라리 이게 무슨 신종 괴롭힘이라든가 하는 편이 나았다. 안 그래도 쪽팔려 죽겠는데 더 나서서 흑역사를 만들게 생겼다.
다행히도 다니엘을 위한 구세주는 더 늦지 않게 친히 강림해주셨다.
“……소란스럽다.”
“주인님! 그게 이놈이!”
다니엘의 왼쪽 팔을 억세게 붙든 이가 그렇지 않아도 피가 안 통할 정도로 잡은 팔을 흔들며 마침내 마주한 그들의 주인을 불러댔다. 이윽고 들려오는 저택의 주인, 푸른수염의 서슬퍼런 목소리에 다니엘은 팔이 아릿하게 아픈 것은 순식간에 안중에도 없어졌다. 저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그들이 딱히 오붓하게 마주 앉아 식사를 하는 사이도 아니었으니 아마도 결혼식을 올린 두 달 전 그 날, 그 밤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게 분명했다. 그 날은 그래도 이정도로 날 선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바른대로 솔직히 고하라.’
아니다. 지금도 그 때도 전혀 달라지지 않은 푸른수염—바스티앵 드 플뢰블레르의 명성 그대로였다. 대체 뭘 보고 착각했던 거지? 무사히 살아남았다고 간이 배 밖으로 굴러나와 버린 게 틀림없었다. 등을 타고 식은땀이 흐르는 다니엘의 머릿속에는 가장 끝에 들은 경고가 다시 되풀이 되고 있었다.
‘뭘 하든 그대의 자유이나, 저택 밖으로 홀로 나가는 것은 금한다.’
지금, 제대로 잘못 걸린 거 아닌가. 다니엘은 점점 눈앞이 깜깜해졌다.
하인들이 충성심이 높다는 건 좋은 일이다.
자신과 결혼했던 아가씨-그들에겐 안주인-가 어느 날 밤중에 마차에 몸을 싣더니 그대로 영영 돌아오지 않게 되었어도, 충성할 상대는 이 푸른수염…한숨이 나오는 별명이지만 아무튼 이 집의 주인인 자신이라는 걸 잘 안다는 점도, 그런 주인을 신경 써 수상한 남자가 침입한 사실을 알아채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부르는 것도 보통은 나쁠 일은 아니다. 자신을 암살하려 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있긴 있다. 사실 많다. 이 저택을 포함하여 몇 대에 걸쳐 쌓아올려진 재산을 노리는 누군가. 그런 사람들을 전부 셀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오늘은 그런 일이 아니다. 칼을 숨기고 있어 묵직한 지팡이를 짚고 있던 손 중 하나를 들어올린다. 하인들은 충직한 개처럼 멈췄다. 저 가녀린… 팔을 좀 놓아줘도 좋을 텐데.
” …그만, 내가 해결할 테니 그만 돌아가 쉬도록. “
확인이 떨어졌으니, 수상한 남자에게 의뭉스럽고 불퉁한 시선을 돌리면서도 하인들이 물러갔다. 그들을 타박하거나 짜증을 내기엔. ‘ 이 수상한 남자는 실은 얼마 전에 너희의 안주인으로 온 ‘아멜리’다 ‘같은 말은 얼토당토않을 테고, 애초에 드레스도 아니고 정장을 입고 있는 ‘아멜리’님을 못 알아본다고 타박하기에도 좀 그렇다. 아멜리님은 우선 방 밖을 많이 안 돌아다닌다. 하녀에게도 귀찮게 굴지 않는다. 어차피 금방 혹은 언젠가라도 사라질 존재에게 정도이상으로 신경 쓰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그들의 주인이 이번 ‘아내’를 어떻게 처리할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태라는 거다. 하지만 본인이 치우는 것과 ‘도망’은 다르다. 푸른수염은 늘 도망을 허락한 적이 없었다. 그게 적이든, 마수든, ‘아내’든 간에.
이야기는 들어야만 했다.
” …변명을 들어주지. “
…사실 별로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는 태도가 아닌 것 같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