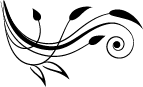돌아서면 잊어버린 걸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봐 (22/04/02)
“야!”
S가 또 다시 멋대로 P의 영역을 침범했다. 노크도 없이, 문을 활짝 열어서는, 그대로 있는 힘껏 소리를 질러댔으므로 P의 기준으로는 충분히 선전포고라 여길 만한 사건이었다. 실내에서도 짙은 먹빛으로 눈을 가리는 안경 뒤로 P가 얼마나 인상을 쓰든 아랑곳하지 않고 S가 귀 따갑게 우짖었다.
“이제는 귀도 먹었냐? 왜 대답을 안 해?!”
“……저걸 진짜.”
P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 위를 빠르게 휘갈기던 손을 멈추고 말았다. 펜을 쥔 손은 심히 힘이 실려 숫제 부들부들 떨릴 지경이었다. 그는 대체적으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짤막하게 쓰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했다. 지난 일을 정리해두는 것은 나중을 위해 기록을 남겨두는 중요한 작업이었고, 또한 스스로의 감정을 정리해두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항상. 누누이. 방해하지 말라고 말해두었음에도.
무시한 S 본인의 잘못이었다.
“셋 세기 전에 꺼져.”
“어쭈. 그런다고 내가 쫄 것 같냐?”
“부디 그러길 바란다.”
작년까지는 자리보전을 하고도 끙끙 앓던 S였으나, 점점 기력을 회복하더니 이 모양 이 꼴이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기어오르고, 처맞을 짓거리만 골라서 하고, 그렇게 뒤치다꺼리를 하고 나서도 다음날이 되면 또 도루묵이었다. 오늘 또한 아주 결판을 내버릴 생각으로 몸을 일으킨 P는 한 걸음 한 걸음 위압적으로 S에게 다가갔다. S 또한 남들에게 지지 않을 만큼 키가 컸으나 P는 그보다도 더 큰 장신의 높이를 자랑했다. 그런 그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천하의 망나니 같은 S도 한순간은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아까 전의 기세는 어디로 가고. P는 피식 웃었다. 고개를 숙인 탓에 흘러내린 보랏빛 앞머리를 슥 쓸어넘긴 그는 그대로 문턱 옆의 벽을 쾅 짚었다.
“야.”
“뭐, 뭐!”
멈칫 굳은 표정을 덮고, S에게서 금세 건방진 기세가 튀어나왔다. P는 그 같잖은 모습을 보다가 이내 벽을 짚은 손을 천천히 내렸다. 손끝이 붉은 머리카락을 건드리려는 찰나, 매섭게 S가 그의 손을 쳐냈다. 사실 이 행동은 고의였다. P는 S가 위압적으로 다가오는 누군가를 극히 꺼려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P가 정해둔 선을 먼저 넘어선 것은 S였으므로, P 또한 S의 선을 넘어서는데 거리낌이 없었다. 짙은 색 렌즈 뒤로 차갑게 타오르는 붉은 눈이 마주한 보랏빛 눈동자는 사정없이 떨렸다.
“까불지, 말라고…….”
“닥쳐. 할 말이 뭐야 그래서.”
서슬 퍼렇게 P가 쏘아붙이자 S는 어떻게든 P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으려 애쓰며 바지의 호주머니를 뒤졌다. 책상 위에 뜬금없이 튀어나온 물건이었다. 그것의 출처가 도통 알 수 없었기에 S는 당연한 수순으로 P가 쓰던 물건이라 판단했을 따름이었다. 괜한 시비가 붙기 전에 얼른 치우려던 것이 일을 더 꼬이게 만들어버렸다. 이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S가 내심 아무리 짜증을 퍼부어도 싸늘한 P의 시선을 앞에 둔 현실은 변할 리가 없었다. 하여간 이 새끼랑 얽히면 뭐가 안 돼. 괜한 트집을 잡으며 S가 불쑥 호주머니에서 손을 꺼냈다.
“이거 네 거잖아! 내 방에서 나왔다고! 괜히 또 없어졌다고 내 탓하지 말고 물건 간수 똑바로 해 새끼야!”
“…….”
S가 짐짓 조금도 기가 죽지 않은 듯 허세를 부리며 막말을 퍼부었다. 그러나 P는 S의 손에 쥐어진 작은 금속제 물건을 보느라 대꾸도 하지 않았다. 손가락 두 마디만한 은색의 물건은 이제는 조금 세월의 흐름을 탄 듯 손때가 앉은 지포라이터였다. P는 대충 S가 생각했을 법한 사고의 흐름을 짐작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그의 것이 아니었다.
“내놔.”
“난 분명히 줬다? 또 나중에 잃어버렸다고 내 탓하면 죽어!”
“알았으니까 그만 꺼져.”
시끄러우니까. 안 해도 될 말을 굳이 덧붙이면 S는 평소처럼 씩씩거리면서 P의 앞에서 주먹질을 하는 시늉을 해가며 한껏 위협을 해댔다. 그러면서도 금세 기세가 죽어 도로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P는 손끝의 감촉만으로 지포라이터의 표면을 더듬었다. 정신 사납게 기하학적인 무늬가 전체적으로 그려진 위에 거슬리게 날개 장식이 얹어진 그것은 도무지 P의 미적 감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흉물이었다. 하지만 분명, 그의 손에 들어오기 전에 이 지포라이터는 누군가의 사랑을 흠뻑 받고 있었다.
‘뭘 봐?’
‘라이터가 안 켜져서.’
‘으이그. 이번만 특별히 빌려준다.’
무척이나 옛날. 십 년은 가뿐히 넘어가는 예전 고등학생 시절로 지포라이터가 P를 이끌었다. 감시하는 시선을 피해 알음알음 그늘지는 곳으로 숨어들어 담배를 피우던 그 때에, 한 개비 툭 꺼내어 입에 물은 P에게 직접 불을 빌려주었던 사람은 S였다.
‘싸구려 라이터보다 낫지?’
‘똑같은 기름 쓰면서 퍽이나.’
‘새끼가 로망을 모르네.’
P가 핀잔을 놓아도 그 때의 S는 한 점 구김 없이 웃으며 흘려 넘기고는 했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본인조차 잊어버린 지금은, 오롯이 P가 그러쥐고 있는 편린에 불과했어도. 그 또한 여전히 지포라이터와 함께 한켠에 보관해 둔 추억 한 조각이었다.
단순히 한 순간 일어난 충동이었다.
그러나 잃어버린 것은 고작 자그마한 조각 하나로는 되돌릴 수 없이 몹시도 커서.
다시 책상 앞에 앉은 P는 일없이 찰칵찰칵 지포라이터를 열었다 닫았다. S는 더 이상 담배를 피지도 않았고, 따라서 불 피울 것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다. 그러니 당연한 수순으로 P의 것이라 단정 짓고는 출처에 대해서 더 생각해볼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시험 삼아 S가 자는 틈에 눈에 띄는 곳에 올려둔 보람도 없이. 퍽이나 안타깝게도. 아쉬워할 틈도 없이.
P는 자그마하게 타오르는 불꽃을 노려보다가 신경질적으로 뚜껑을 덮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