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일린은 소파 위에 길게 드러누워 있었다. 퍽 느긋하게도. 그 앞으로는 니아흐가 무슨 짐을 산더미처럼 나르고, 나르고, 또 날랐다. 그게 누구의 소유인지 뻔히 알면서도 저는 전혀 거들지도 않았다. 각자가 할 일이 있었고, 그것을 섞어버리는 짓은 오히려 분란만 조장할 규칙 위반이었다. 그러니 그는 가만히 풍경을 감상하듯 응시하면서, 주어진 과일이나 착실히 허비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다.
―저건 왜 저렇게까지 부지런하게 사는 거지?
물론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고 그 중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전력으로 종사하는 것이 잘 맞는 이도 얼마든지 있었다. 레일린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가 보기에는 니아흐도 그런 종류인 것 같았다. 그러니까 매번 뭘 시켜도 잔말 없이 하고, 안 시켜도 뭔가 하고, 안 보인다 싶으면 다른 데서 또 이것저것 이고 지고 나르고. 꼭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처럼.
아, 내기 때문인가. 맥락없이 그들 사이의 조건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것도 레일린의 기분이나 맞추라는 것이지, 굳이 집안의 자질구레한 일까지 다 할 까닭은 되지 못했다. 그런데도 일람조차 아닌 니아흐는 꼭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초조해했고, 누군가가 일을 맡기면 오히려 감사하다고 할 정도였다. 고작 그런 것에. 감사할 일도 참 많기도 하지. 레일린은 스스로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는 곧 그 감정을 느릿느릿 되짚어갔다. 그럼 나는 무엇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인가. 니아흐가 이곳에 적응하는 것이 썩 나쁜 일은 아닐 터.
―명령을 듣고 싶은 거라면 내 말만 들으면 좋을 것을. 삐죽하니 불퉁하게 튀어나오는 것은 선명한 소유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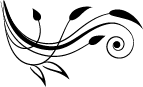
어……뭐 쓰고 싶었던 건지 까먹었다. 생각나면 더 추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