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언가 꿈을 꾼 것 같기도 했다. 잘 마른 천이 바람에 나부끼며 사락사락 흔들리는 것을 본 듯한. 거처가 바뀐 후로는 좀처럼 꿀 일 없었던 포근한 종류의 꿈이었다. 그리고 그 천자락이 실은 흔한 문틈 사이 빛이라는 걸 어렴풋이 깨닫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새하얀 한낮의 색과 함께 붉은 빛깔이 불쑥 튀어나왔다. 널어놓은 천들 사이로 위험하게 일렁이는 불꽃처럼 눈앞에서 참으로 거슬리게 어른거렸다. 닫히다 만 열린 문틈 사이로 비치는 색채는 오래 머무르지 않고 다만 눈앞을 어지럽히듯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또는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가벼이 오갔다. 니아흐는 그를 무겁게 끌어내리는 이불 틈으로 그 붉은 빛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을 마냥 바라보았다.
일렁이는 불꽃은 몹시 사납기만 했다.
다시 깜박 눈이 감겼을 때, 사나운 불길이 아끼던 천을 모조리 불사르는 것을 보았다. 너울거리는 불꽃 사이로 타다 남은 재가 흩날리는 탄내에서는 익숙한 악몽의 냄새가 났다. 그 불꽃이 저까지 삼키려는 듯 넘실거릴 즈음에. 기습적으로 바람 사이에서 천이 팔락팔락 나부끼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가하면 아까부터 웅얼거리듯 멀리서 들리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보다 분명한 세기로 다가오려 했다. 니아흐는 여전히 흐릿한 눈을 감았다 도로 떴다. 졸린 그대로 다시 잠들어도 될지 판단이 들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일어날 만큼 하고 싶은 게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는 끝내 눈을 감았다가, 다시 잠깐 생각을 바꿔 좁은 틈새의 광경을 바라보았다.
여느 때처럼 삐딱한 자세로 선―뼈대가 아주 휘어버린 게 아니고서야 늘상 저리 삐딱할 수가 없었다―그는 무언가 종이를 한 무더기 들고 있었다.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선명하게 제 빛깔대로 타오르는 듯한 머리카락 사이로 언뜻 보이는 표정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찡그려진 미간 사이 주름이 그의 날카로운 수려함을 오히려 돋보이게 하니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었다. 팔랑팔랑 종이 넘기는 소리가 퍽 거침없었다. 뭔가를 뜯어서 구깃구깃 구겨서 내던지는 소리까지. 그런가 하면 어떤 지면에서는 어디선가 꺼내든 펜으로 무언가를 급하게 휘갈겨 쓰기도 했다. 가끔 듣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펜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귓가에 부드럽게 닿았다. 그렇게 급하게 쓰니 어디선가 글자를 잘못 썼는지 펜촉이 박박 종이를 긋는 소리까지 났다. 시끄럽게. 니아흐는 거의 수마에 잡혀가는 와중에도 인상을 찡그렸다.
“―지 말고. 내 말 알아들어?”
본 척도 하지 않아서 착각인 줄 알았더니, 아까 눈이 마주치긴 한 모양이었다. 누군가에게 짜증스럽게 말을 거는 그대로 문 앞까지 다가온 레일린이 그림자를 드리우더니 그대로 문을 닫았다. 짙은 적막에 다시 잠들기까진 오래 걸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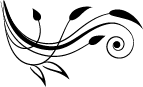
노친네들이 죄다 노망이 났나. 자기가 쓴 표현에 스스로가 들어가는지 아닌지는 그리 고려하지 않은 채로. 문을 최대한 살살 닫고도 씨근거리면서 레일린은 제게 온 두터운 서류 뭉치를 다시 처음부터 펼쳐 읽었다. 이게 대체 몇 번째야. 빌어먹고도 남을 만큼 구구절절한 관례와 절차에 맞게 작성된 탄원서는 방 한 칸의 벽에 한 장씩 다 붙여도 모자라지 않을 것 같았다. 이걸 언제 다 읽으라고 보내놓고 있어. 신경질적으로 벅벅 머리를 긁던 레일린은 그럼에도 싹 다 불태워서 무마하기에는 그로서도 썩 편하지 못할, 해서 온전히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을 빠른 속도로 읽어 내렸다. 그렇다 해서 그가 모든 내용을 기꺼워했다는 건 아니었다.
……일람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개소리고.
……더 이상의 방종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뭐라는 건지.
……라나시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자리에 어떻게 올랐는지 모르는 놈이 설마 있으려고.
그렇지 않아도 두꺼운 글줄은 똑같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으로 몇 번이나 반복되는 구간이 있었다. 결론을 낸다면 한 문장으로 끝낼 수도 있을 것을,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몰라도 굳이 그 작자들이 쓴 글들을 합쳐놨으니 참으로 지루하고 따분하기 그지없었다. 해서 레일린은 본인들에게 분풀이 할 수 없는 대신 애먼 종이를 북북 찢는 것으로 해소했다. 귀하신 인장이 찍힌 문서니만큼 보존에 신경을 쓰기는 해야겠지만, 어차피 중복되는 내용 몇 장 빠진다고 문제가 생길 리가. 하여 쩔쩔매는 몫은 옆에서 레일린의 날선 짜증에 고스란히 노출되어야 하는 시종들이었다. 레일린이 이면지랍시고 주욱 찢어낸 탄원서 중 한 장의 뒷면에 대충 답변을 써갈겨놓은 종이를 품에 안은 시종이 조심스레 물었다.
“정말로, 이걸 그대로 전달해도 되겠습니까?”
“안될 거 있나?”
자기가 보고하지 않는다고 레일린은 퍽 태연자약하게 대꾸했다. 요컨대, 비루한 애완동물을 키울 거면 집 안에서나 키우지 밖으로 내돌려서 망신시킨다는 탄원서에 그는 그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답을 내놓을 작정이었다. 내가 언제는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했던가. 무엇도 내놓을 생각 없는 레일린은 제가 내린 명령을 철회하지 않고 고개만 까딱 움직여 그대로 실행할 것을 종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