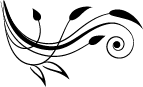이따금 자고 싶지 않은 밤이 오기 마련이었다. 달빛이 좋아서든, 어떤 소음도 들리지 않는 고즈넉함이 좋아서든, 또는 단순히 잠이 오지 않아서든. 간간히 풀벌레 우는 소리가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것을 뒤로 한 채 필리아는 서재의 책상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다. 한 손에 펼쳐둔 책을 받쳐둔 채로, 다른 손으로는 책장이 넘어가지 않게 붙잡아 눈으로는 집중해서 글줄을 읽어나갔다. 은은한 작은 화등에 의지해 읽을 수 있는 활자는 어쩐지 자잘하게 느껴졌다. 그럼에도 따분한 밤을 지루하지 않게 넘기기에 적당한 두께의 책만한 것이 없었다. 해가 뜰 시간까지 걷는 것도 좋겠으나 이번 밤만큼은 고를 수 없는 선택지일 것 같았다. 가까스로 옆으로 새어나갈 뻔한 시선을 다잡으며, 필리아는 팔락 책장을 넘겼다.
누구에게나 불시에 찾아오는 자고 싶지 않은 밤이란. 필리아에게 있어 불면은 병증이라기보다는 일상에 가까웠다. 거리낄 것도 꺼릴 것도 아닌 평이한. 그러나 지금은 어쩐지 예외적인 이유 또한 이것저것 있었다.
“너 계속 그러고 있게?”
필리아는 끝내 참지 못하고, 대뜸 제 옆자리를 향해 쏘아붙였다. 책상의 한 축을 지탱하는 서랍과 필리아의 다리를 끼고 비스듬히 기대 앉은 아퀼라는 저를 부르는 말을 들었음에도 태평하게 하품을 했다. 늘어지는 하품은 곧 훌쩍이는 재채기로 바뀌어버렸다. 그러게 추우면 방에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필리아가 서재로 쓰는 이 방은 천장이 높아 아무리 불을 피워도 일정 이상은 따스해질 수 없었다. 여전히 열기를 내뿜으며 맹렬하게 불을 피우는 벽난로를 확인한 필리아는 다시 아퀼라를 째려보았다.
불길이 일렁이는 벽난로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자리에 앉은 아퀼라는 그럼에도 본인이 침대에서 덮는데 쓰는 솜이불을 꼭꼭 덮고 앉아 있었다. 애착이불이라도 되는지 그는 항상 사시사철 그 두꺼운 이불을 고집했다. 말이 덮었다는 것이지 거의 이불 고치나 다름 없는 꼴이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손이 닿는 곳에는 잠이 안 온다며 조르고 졸라 얻어낸 코코아도 한 컵 가득 있었다. 특별히 내어 준 온도 보존 마법이 걸린 컵은 만든 목적대로 마법적인 능력을 구사할 수 없는 필리아의 손에서도 충분히 제 할 일을 해냈다. 그 모든 것이 있어도 문틈으로 새는 밤의 찬 공기는 쉽사리 열기를 빼앗으니, 아퀼라는 잊을만 하면 코를 훌쩍거렸다. 이러다 또 누구 탓을 하려고. 필리아는 머리 한 켠이 지끈거렸다.
“안 자냐? 지금 몇 신지 몰라서 이래?”
“너도 안 자잖아.”
“내가 안 자는 게 하루 이틀이야? 내가 안 자는 거랑 네가 안 자는 게 같은 것도 아니고.”
“같은 거야.”
달큰한 향이 모락모락 나는 컵을 들고 입 안 가득 초콜릿을 녹인 물을 삼킨 아퀼라가 히죽거렸다. 하여간 도통 말을 들어먹질 않는다. 필리아는 질린 얼굴을 하고는 다시 펼쳐놓은 책에 눈을 돌렸다. 그리고는 이미 5번은 읽었던 문장을 6번째로 한 번 더 읽었다.
“야, 야.”
그리고 이번으로 7번. 필리아는 기어이 한숨을 내뱉고 말았다. 처음에는 그냥, 두 번째는 무릎 좀 빌린다고, 세 번째는 이불 가져다 달라고, 네 번째는 자기도 책 읽고 싶으니 골라달라고, 다섯 번째는 입이 심심하니 뭐든 간식거리 만들어 달라고. 이번에는 또 뭐라고 하려고. 필리아는 책을 아예 덮어버렸다.
“가서 그만 자라. 아니면 내가 널 침대에 던져버리는 수가 있어.”
“뭘 그렇게나.”
장난스럽게 웃는 아퀼라는 필리아의 서슬 퍼런 엄포에도 여태 그랬던 것처럼 또 다시 필리아를 쿡쿡 찔렀다. 야야야아. 귀따갑게 불러대는 소리는 거의 귀에 눌어붙은 자국처럼 남을 지경이다.
“나 ** 추워.”
“가서 자라.”
“귀찮은데 네가 옮겨줘라.”
“이게 진짜.”
“지금은 무거운 것도 잘 들거고, 나도 들어올릴 수 있을 거 같은데.”
저놈의 밉살맞게 히죽거리는 표정하고는. 필리아는 여느 때처럼 아퀼라를 사납게 쏘아보다가 이내 홱 고개를 뒤로 꺾었다. 유달리 피곤한 밤이 아닐 수 없었다. 책에 집중하기도 글렀다. 더럽게 귀찮네……. 필리아는 초점이 나간 멍한 눈으로 천장을 지탱하는 얼기설기 엮인 나무 기둥을 느릿느릿 세었다. 그렇게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축 늘어지는 동안에도 그의 허벅지는 수시로 손가락에 쿡쿡 눌렸고, 벽난로의 불길은 나른하게 타닥타닥 타들어갔으며, 아퀼라는 아침나절에 짹짹거리는 조그만 새처럼 쉴새없이 곁에서 재잘거렸다. 아.
“방에 던져버리면 그대로 자라. 기어나와서 또 귀찮게 굴기만 해.”
“안 할게 안 할게.”
“아나. 내가 대체 왜…….”
투덜투덜하면서도, 필리아는 착실하게도 두껍게 말린 이불 고치를 품에 안고 들어올렸다. 안 그래도 두터운 솜이불의 무게에 아퀼라의 무게가 더해져 필리아는 조금 자세를 잡는데 애를 먹었다. 이불 고치 속에서 키득키득 웃는 소리가 얄밉게도 들렸다. 꼬집는다 해도 이불의 두께 때문에 타격감도 없을 것이다. 빌어먹을. 내일 아침만 되면 머리털이라도 뽑아주지. 필리아가 이를 부득부들 갈면서 천천히 서재에서 내려가는 계단을 밟을 때였다.
“오 진짜 되긴 하잖아? 안 되면 *** 비웃어주려고 했는데.”
“이 자식이.”
“아니 너 저번에는 ** 완전히 못 했잖아. 그런데 몸이 좀 바뀌었다고 되나 했는데. 이게 되네.”
아퀼라가 하는 말이 아주 틀리지는 않아서. 필리아는 기꺼이 그를 바닥에 떨어뜨리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이상하다면 이상하고, 아니라면 아닌 그런 일이었다. 몸이 좀 바뀌었다고 쓸 수 있는 근력이 달라지고, 능력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가 하면 그럴 수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적응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그런 시간들이었다. 그리고 필리아는 자기와 떨어뜨릴 수 없는 그 특성이 제 동거인에게서 묘한 관심을 끌어내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느끼기도 했다. 한 칸 한 칸 계단을 밟아 내려가면서, 필리아는 천천히 말을 골랐다.
“……야.”
“뭐야, 나 ** 졸려.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여태 까불어놓고 이제 졸리냐?”
“어.”
필리아가 어이없다는 시선을 따갑게 보내도 아퀼라는 졸립다는 말 그대로 눈을 감고 고른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 걸음걸이에 맞춰 삐죽 튀어나온 금발이 하늘하늘 흔들렸다. 그래, 졸릴 만도 할 것이다. 시간이 몇 신데. 매끄러운 이불자락에 미끄러져 놓칠까 한 번 고쳐 안은 필리아가 입을 열었다.
“생각해보니까 너 꼭 내가 이럴 때만 들러붙는 거 같아서. 이유가 있나 했지.”
“……그야, 뭐. 지금 너 마법 못 쓰니까.”
이건 또 새로운 시비군. 필리아의 눈이 가늘어졌다. 달리 무슨 대답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어도 이런 시비는 어떻게 갚아주어야 속이 풀릴까 고민하던 찰나에.
“―….”
반쯤 잠의 경계에 발을 걸친 아퀼라의 중얼거림이 필리아의 귀에 닿았다. 때마침 아퀼라가 쓰는 방 앞에서 문을 열려던 그는 멈칫했다. 제대로 들은 게 맞나? 하지만……. 한꺼번에 여러 생각이 떠오른 나머지 침대에 내던져버리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무색하게 필리아는 깊게 잠들어버린 아퀼라를 툭 내려주고 말았다.
그러게, 왜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들의 처지는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