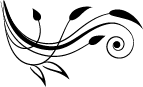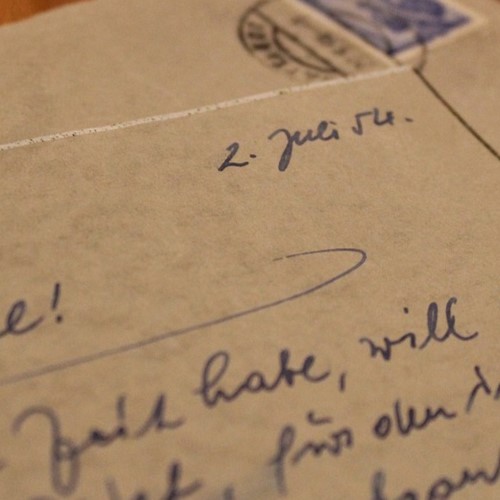바스티앵이 막 샤워를 마치고 머리 위에 수건을 얹고 침대 위에 걸터앉으려던 때였다. 그는 묘한 기척이 느껴지는 문가를 날카롭게 노려보았다. 암살자라고 하기에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었다. 그것도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온 침입이라니. 바스티앵은 곧 불을 완전히 꺼둔 방을 한 바퀴 돌았다. 침대 옆 협탁에는 휴대용으로 두는 등불이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손길로 잡은 작은 등에 불을 당겼다. 치이익……소리와 함께 은은한 불빛이 넓은 실내를 비췄다. 그와 동시에 여전히 문가에 붙박인 듯 꼼짝도 하지 않는 짙은 금빛이 어른거렸다. 한숨도 나오지 않아서, 바스티앵은 그 방향으로는 시선조차 향하지 않고 툭 말을 던졌다.
“숨소리가 조금 더 컸으면, 그대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이다.”
“……저라고 여기에 있고 싶어서 있는 건 아닙니다.”
제법 주눅이 들 법한 날 선 말을 꺼내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부루퉁하게 투덜거리는 대꾸가 돌아왔다. 그랬겠지. 비밀통로로 오갈 때와 다르게 지금의 다니엘은 침실 문 앞에 서 있는데다, 잘 보면 복장 또한 여성이 입는 낮의 복장 그대로였다. 드레스보다는 좀 더 편한 차림이긴 하지만. 보통은 묶고 다니는 머리는 지금은 풀어헤쳐진 채 되는대로 늘어뜨린 채로. 잘 먹이고 뛰게 해도 영 가늘기만 한 팔다리까지 합쳐 놓으니 흐릿한 시야에 얼핏 보면 멀대같이 키만 큰 아가씨일 뿐이다.
바스티앵이 봐 온 사람들 중에 과연 저 다니엘만큼이나 허술해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 제 앞에 서는 사람치고 주눅이 들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제 할 말을 다 하는 사람도 다니엘뿐이었다. 하면, 이번에는 또 무슨 말을 주워듣고 들이닥친 것인가. 그는 순간 짙은 피로감을 느꼈다.
“내가 딱히 호출한 기억도 없는데.”
“당신의 직속 시종이 찾아가라고 말을 전했습니다만?”
아. 그 말에는 바스티앵도 짚이는 바가 하나 있었다.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은 다니엘의 다음 거취가 좀처럼 정해지지 않아서. 한 번은 시종에게 제 아내를 보거든 자기를 찾아오라는 말을 전하라고 명령을 내렸더란다. 문제는 하필 그 직후에 국경 수비에 비상이 걸렸고, 때마침 ‘아멜리 부인’께서는 비밀 서고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활자와 함께하는 취미가 들려버렸다. 그리하여 보름 가까이 지나서 말한 사람도 잊어버린 다음에야 찾아왔다는 소리인데. 좋은 시간 다 놔두고 왜 자정에 가까운 지금 시간에 슬그머니 기어들어 왔을까.
아무렴. 바스티앵은 아직 덜 마른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꾹 쥐어짰다. 물어봐야 시원찮을 대답만 들을 테니 시간 낭비였다. 자기 전에 꽤나 골칫거리인 문제가 드디어 해결되기만 한다면야.
“고민할 시간은 충분히 준 것 같으니, 이제 그만 다음 거취나―.”
“다짜고짜 또 시비이십니까?”
……좋게 끝나길 기대한 게 잘못이지.